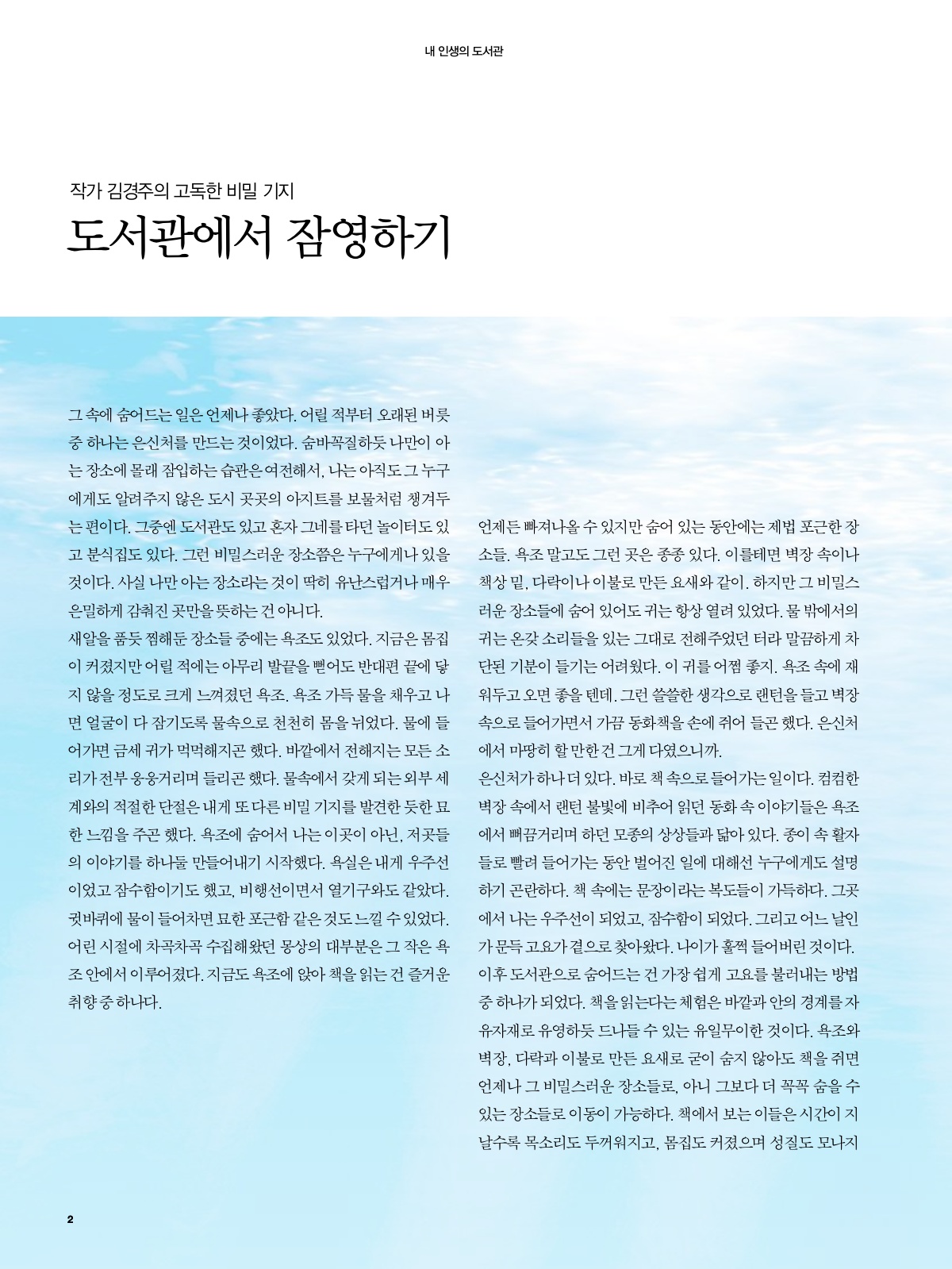
2페이지 내용 : 내 인생의 도서관 작가 김경주의 고독한 비밀 기지 도서관에서 잠영하기 그 속에 숨어드는 일은 언제나 좋았다. 어릴 적부터 오래된 버릇 중 하나는 은신처를 만드는 것이었다. 숨바꼭질하듯 나만이 아 는 장소에 몰래 잠입하는 습관은 여전해서, 나는 아직도 그 누구 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도시 곳곳의 아지트를 보물처럼 챙겨두 는 편이다. 그중엔 도서관도 있고 혼자 그네를 타던 놀이터도 있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지만 숨어 있는 동안에는 제법 포근한 장 고 분식집도 있다.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소들. 욕조 말고도 그런 곳은 종종 있다. 이를테면 벽장 속이나 것이다. 사실 나만 아는 장소라는 것이 딱히 유난스럽거나 매우 책상 밑, 다락이나 이불로 만든 요새와 같이. 하지만 그 비밀스 은밀하게 감춰진 곳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러운 장소들에 숨어 있어도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물 밖에서의 새알을 품듯 찜해둔 장소들 중에는 욕조도 있었다. 지금은 몸집 귀는 온갖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었던 터라 말끔하게 차 이 커졌지만 어릴 적에는 아무리 발끝을 뻗어도 반대편 끝에 닿 단된 기분이 들기는 어려웠다. 이 귀를 어쩜 좋지. 욕조 속에 재 지 않을 정도로 크게 느껴졌던 욕조. 욕조 가득 물을 채우고 나 워두고 오면 좋을 텐데. 그런 쓸쓸한 생각으로 랜턴을 들고 벽장 면 얼굴이 다 잠기도록 물속으로 천천히 몸을 뉘었다. 물에 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가끔 동화책을 손에 쥐어 들곤 했다. 은신처 어가면 금세 귀가 먹먹해지곤 했다. 바깥에서 전해지는 모든 소 에서 마땅히 할 만한 건 그게 다였으니까. 리가 전부 웅웅거리며 들리곤 했다. 물속에서 갖게 되는 외부 세 은신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컴컴한 계와의 적절한 단절은 내게 또 다른 비밀 기지를 발견한 듯한 묘 벽장 속에서 랜턴 불빛에 비추어 읽던 동화 속 이야기들은 욕조 한 느낌을 주곤 했다. 욕조에 숨어서 나는 이곳이 아닌, 저곳들 에서 뻐끔거리며 하던 모종의 상상들과 닮아 있다. 종이 속 활자 의 이야기를 하나둘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욕실은 내게 우주선 들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선 누구에게도 설명 이었고 잠수함이기도 했고, 비행선이면서 열기구와도 같았다. 하기 곤란하다. 책 속에는 문장이라는 복도들이 가득하다. 그곳 귓바퀴에 물이 들어차면 묘한 포근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에서 나는 우주선이 되었고, 잠수함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인 어린 시절에 차곡차곡 수집해왔던 몽상의 대부분은 그 작은 욕 가 문득 고요가 곁으로 찾아왔다. 나이가 훌쩍 들어버린 것이다. 조 안에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욕조에 앉아 책을 읽는 건 즐거운 이후 도서관으로 숨어드는 건 가장 쉽게 고요를 불러내는 방법 취향 중 하나다. 중 하나가 되었다. 책을 읽는다는 체험은 바깥과 안의 경계를 자 유자재로 유영하듯 드나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욕조와 벽장, 다락과 이불로 만든 요새로 굳이 숨지 않아도 책을 쥐면 언제나 그 비밀스러운 장소들로, 아니 그보다 더 꼭꼭 숨을 수 있는 장소들로 이동이 가능하다. 책에서 보는 이들은 시간이 지 날수록 목소리도 두꺼워지고, 몸집도 커졌으며 성질도 모나지 22

3페이지 내용 : 고 해선 안 될 짓도 서슴없이 하곤 했다. 물론 그만큼 책 바깥에서 보는 세계의 풍경들 김경주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된 이후 시인이자 도 잔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차라리 활자 속에 풍덩, 빠지는 편이 좋았다. 극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쨌거나 도서관에서 신분을 감추고 독서를 하는 것은 내게 낮을 밤으로 만들고, 타인 시집으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기담》 《시차의 눈을 달랜다》 《고래와 수증기》를, 과 함께 있어도 언제나 홀로 있게 해주는 놀이의 연장이다. 희곡집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곁엔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 《블랙박스》 등을 펴냈다. 내게 도서관은 욕조에 귀를 놔두고 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진다. 서가 에 꽂혀 있는 각기 다른 판형의 책들, 그것들에 둘러싸여 두런두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의 세계에 머물고 있었다. 처음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내가 마주한 풍경은 그랬다. 다들 달칵, 하고 닫힌 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공을 거닐며 숨어 있었다. 가끔 차원은 다르지만 나와 같은 장소를 디디고 있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은밀하게 애 정하던 책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일면도 없는 사람에게 드는 반가움이 좋다. 널찍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은 환한 대낮에도 밤처럼 고요했다. 각자에게 찾아든 고요가 모여 거대한 욕조를 만든 것만 같았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웬만한 음파 의 세기로는 결코 침투할 수 없는 깨끗하고 단순한 닫힘의 세계. 증강현실과 같은 체험이 이와 비견할 수 있을까. 책을 읽지 못한 날엔 가끔 쓸쓸해지곤 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꺼풀이 감길 때까지 언제나 도킹되어 있는 온라인 네트 워크는 온종일 혼자 있어도 무수한 소음들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방치한다. 고요가 결 코 찾아올 수 없는 서글픈 고독. 그런 고독들이 모여 지하철을 메우고 거리를 메우고 카 페를 메우고 있다. 나는 그들의 피로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종종 도서관에 간다. 거대 한 욕조에 모여 각기 다른 영법으로 고요 속을 헤엄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자의적 으로 홀로 있기를 선택한 자들, 그들이 펼친 페이지마다 달칵, 하고 열리는 방대한 세계 들. 그 속에 숨어 있으면 이윽고 뻑뻑했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긴다. 희한하게도 도서관 에서는 눈꺼풀이 자꾸 감겨도 책을 완독하고야 만다. 책을 읽으면 잠을 자지 않아도 꿈 을 꾸게 되듯이. 도서관에서는 귀도 쉽게 잠이 든다. 고요가 찾아들면 이내 밤이 되는 것처럼. 글 김경주(작가) 3